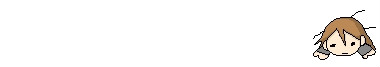|
그가 떠난 해가 1990년이었던가?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곳곳에서 발길을 잡고 가슴을 시리게 했던 가을과 겨울이었다.
그때 나는 남도 끝자락에서 징역을 사는 남편 면회를 다니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아홉 시간의 고속버스를 탔다.
당시 내 나이 서른 셋... 무청처럼 싱싱했던 젊은 과부는
지루하고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그 남자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건넜다.
마침내 테잎 세 개가 다 늘어졌고 귓전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늘 환청처럼 맴돌았다.
6집의 <겨울바다>는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눈물이 났다.
가끔은 멀리 있는 남편보다 귓전에 속삭이는 그 남자의 음성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남편의 징역살이보다 그 남자의 죽음이 더 내 가슴을 아프게도 했다. ㅎㅎ
그건 분명 연애감정 같은 거였지. 얼빠진...
오늘 아침엔 갑자기 문세와 연애를 하고 싶어졌다.
꿈에서 그가 나를 위해 <시를 위한 시>를 불러줬기 때문이다.
얼마나 슬픈지 흑흑 느껴울다가 잠에서 깨어나 얼른 인터넷을 열고 그의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사실 평소에 이문세 풍의 노래들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다.
하나하나로 보면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곡들이지만... 아주 가끔, 그것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나 와닿는 (‘해바라기’의 곡들처럼?).... 지나치게 착하고 비슷비슷하기도 해서 두 번 이상 듣기 힘든....
이문세 역시 감성적이고 위트있는 재간꾼이지. 크게 보면 좋아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가수지만 ‘나의 특별한 가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간밤에 나를 위한 시를 읊어가지구설랑...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사랑이 지나가면>......
오, 한 곡 한 곡이 명곡일세. 특히 4집과 5집의 곡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영훈 추모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내 마음은 정체모를 슬픔에 제대로 빠져 빠져나올 줄을 모른다. 내 안에는 아직도 덜 자란 사춘기 소녀가 관념적인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나 보다.
오, 가여운 인생들이여.. 가여운 나여... 어떻게 외로운 직립보행을 견디며 살아간단 말인가.
어떻게 홀로 태어나 홀로 돌아간단 말이냐.
취향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 게다가 오늘 아침에 좋았던 노래를 오후에 구리다고 구박하기도 하는 내 변덕스러운 기분은 이런 얼빠진 글을 곧 어이없어 할지도 모르지만... 뭐, 잎새들도 편히 누워 쉬는 가을이니까. ^^
'내게로 가는 길(~2014) > 재미·취미(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Our last summer - Mamamia O.S.T. (0) | 2009.10.07 |
|---|---|
| 盛夏的果實(한여름의 과실) (0) | 2008.12.09 |
| 영화메모1 - 연애를 하라고? (Fall in love, if you dare) (0) | 2008.10.20 |
| What's eating Gilbert Grape? (0) | 2008.10.17 |
| my little corner of the world (0) | 200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