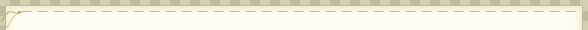
웬일로 남편이 저녁 아홉시 뉴스 전에 귀가했다.
새로 이사온 동네 정찰 나가려고 일찍(!) 왔다나.
헬렐레 좋아라고 운동화 챙겨 신고 따라나서니 휘영청 보름달도 우릴 따라 나선다.
당연히 조경이 아름다운 2단지 쪽으로 가려니 했는데 웬걸, 별로 볼 것도 없는 우리 단지 뒤쪽길로 빠져 한창 길을 내느라 파헤쳐놓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간다.
아니, 왜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투덜거리면서도 가로등 하나 없는 검은 숲 속에서 혼자가 될까봐 기를 쓰고 따라가는 나. 밤눈도 어둡고 시원찮은 발목이며 무릎 때문에 발아래가 영 불안하기만 하여 더듬더듬 속도를 낮추니 이 양반 걸음을 멈추고 날 기다렸다가 아예 손목을 끌고 간다. 내가 잘 써먹는 수법(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갔다 와)을 잘 알고 있거든.
잠깐의 황무지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허나 잠깐의 공사현장을 지나고 나니 아주 쾌적한 등산로가 나온다. 나같은 노약자(!)도 무리없이 전망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8부능선길이 꼬불꼬불 꽤나 길게 이어진다. 원래 이 동네 주민들이 즐겨찾는 산인 듯 중간중간 운동기구를 놓아둔 곳과 등산로 표시판도 보인다. 아하~ 우리 단지에서 동네 산으로 곧장 통하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정말 뜻밖의 횡재 아닌가. 길 하나 건너면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이 있기 때문에 '산 가까운' 동네다, 좋아라 했는데, 한술 더 떠 우리 집 마당이 바로 산자락이라니....그것도 꾸민 산이 아닌 진짜배기 야산 말이다.
교교한 달빛 아래 촉촉한 밤의 숲 냄새를 만끽하며 30분 쯤 걸으니 제법 땀이 난다. 혹시 밝은날 보면 오늘밤의 느낌이 안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침에 한바퀴씩 돌 생각이다. 포장 안 된 흙길을 밟는 것만으로도 삶의 에너지가 충전될지도 모르지.
남편은 어딜 놀러가도 보라는 장소보다 그 뒷길이나 옆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헛다리를 짚기도 하지만 가끔은 의외로 남들 모르는 세상을 발견하여 날 감동시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입주한 사람들 중 잘 꾸며진 단지 내 산책로 제쳐놓고 황무지 같은 이 야산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도 대낮에 수시로 지나치지만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양반은 늦은밤 퇴근을 하면서 저 우북한 산속을 우선 뒤져봐야겠다고 눈여겨 봐뒀단다. 참 특이한 양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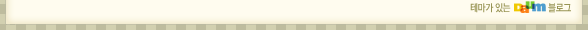
'그 시절에(~2011) > 陽光燦爛的日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졸지에 못된 아짐씨가 된 사연 (0) | 2006.09.21 |
|---|---|
| 젊음의 노트를 다시 꺼내 보니 (0) | 2006.09.11 |
| 와야 할 사람이 안 왔구나 (0) | 2006.09.06 |
| 새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0) | 2006.09.05 |
| 불붙은 하늘 (0) | 2006.08.20 |